글 김흥숙/그림 김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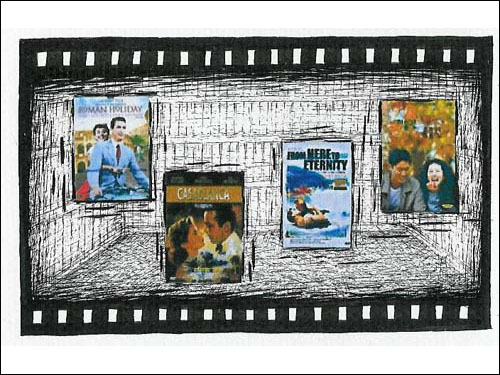 |
| ▲ 꿈을 팔던 비디오 가게. |
| ⓒ 김수자 |
리모컨을 돌리던 중 우연히 본 케이블 텔레비전, 모처럼 좋은 영화를 하는가 했더니 곧 끝나버립니다. 다시 해주겠지, 몇 주 동안 기다려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영화는 수도 없이 반복해 틀어주면서도 볼 만한 영화는 한 번 슬쩍 보여주고 그만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나의 인생은 영화관에서 시작되었다>를 읽다보면 보고 싶은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닙니다. 그녀는 극장에서 놓친 영화를 비디오로 구해 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십 년 전만 해도 동네 어귀엔 언제나 비디오 가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앉을 곳을 찾지 못하는 하오, 바람에 구르는 잎사귀처럼 깨진 보도블록 사이를 걷다 보면 이윽고 철물점과 문방구 사이 ‘꿈 비디오’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꿈이란 낮은 곳에서 꾸는 것, ‘꿈 비디오’는 길에서 계단 두어 개를 내려가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길버트 그레이프>의 어머니는 통과하지 못할 좁은 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살집 좋은 모니터가 어울리지 않게 작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오른쪽 벽부터 모니터 뒤편까지 이어진 슬라이딩 붙박이장 속엔 온갖 비디오가 두 겹으로 빼곡했습니다.
맨 오른쪽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과 <지상에서 영원으로> <로마의 휴일> 등 고전이 되어버린 영화들이 가득했고, 그 다음 서너 칸엔 고전까지는 안 되어도 좋은 평을 듣는 영화들, 그 다음은 무협 영화들, 그 옆엔 소위 ‘빨간 영화’라 불리던 성인 영화들. 컴퓨터와 책상 안쪽에 주인용 의자가 하나 있고 그 뒤편, 손님들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엔 새로 나온 좋은 영화, 즉 찾는 사람이 많은 영화들을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좋아하는 손님이 오면 우선적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처음엔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눈이 크지도 않으면서 자꾸 크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저는 불필요하게 큰 눈을 싫어하는데, 그는 눈이 크고 둥글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눈만큼이나 둥글어 처음 몇 번은 그를 보면 어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개의 눈 큰 사람들과 달리 눈에 힘을 주는 일이 없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크고 둥근 것들을 태양 닮은 것과 달 닮은 것으로 나눈다면, 그는 분명히 달 쪽에 속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꿈 비디오’와 잘 어울리는 게 당연했지요. 한 평 반이 될까 말까 한 가게 안에서 그는 여름에조차 추워 보였습니다. 언제나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할 말은 있지만…'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배달을 안 하는 건 물론이었지요. 사실 그가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지요. 그에 대해 아는 건 그와 내가 동갑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깨진 보도블록들 때문이었는지 세상이 낯설어서였는지, 그때 저는 넘어지는 일이 잦았고 넘어졌다 하면 깁스를 하였습니다. 한번은 발에서부터 무릎 위쪽까지 깁스를 하는 바람에 여러 주일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앉아 있기도 힘드니 책 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꿈 비디오’에 전화를 걸어 변명하듯 사정을 얘기하고 비디오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내키지 않는 음성이 영 미안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집을 찾아 온 그의 손엔 이탈리아 국영방송에서 제작한 텔레비전 시리즈 <옥토퍼스> (원제는 < La Piovra >. '문어'라는 제목은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살아나는 마피아를 뜻함) 1,2,3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꿈 비디오 생기고 처음이에요, 집에 갖다 주는 거…. 다 해서 열여덟 편인가 그래요. 매일 세 편씩 봐도 한참 볼 수 있어요.” 그가 현관에 서서 얘기했습니다. 엉덩이 걸음으로 그를 맞아 비디오 세 개를 받았지만 “들어오세요”란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카타니 경찰서장과 마피아의 싸움을 지켜보다 보니 꿈속에서도 총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프레스토, 프레스토 (우리말로 ‘빨리, 빨리’)” 같은 이탈리아어가 귀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엔리오 모리코네의 음악은 시종일관 아름다웠지요.
그날부터 시리즈를 다 볼 때까지 그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다 본 비디오와 새 비디오를 바꿔갔지만 그나 저나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말없이도 편한 사이란 게 얼마나 드물고 귀한 건지 몰랐습니다.
깁스를 풀고 바쁜 생활에 복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꿈 비디오’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손님이 줄어 하는 수 없이 그만둔 거였는데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옥토퍼스>를 사고 싶다고 하자 “저건 제가 워낙 좋아해서 가져갈 거예요” 하며 심상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크고 둥근 눈과 모나지 않은 얼굴은 그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창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꿈 비디오’ 간판이 ‘왕 비디오’로 바뀐 후 우연히 예전처럼 붙박이장 맨 위에 꽂혀 있는 <옥토퍼스>를 보았습니다. <옥토퍼스>를 소장하고 싶던 그의 꿈이 ‘꿈 비디오’와 함께 무너져버린 게 아닌가싶어 마음이 싸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구할 수 없을 때는 언제나 ‘꿈 비디오’가 생각나고 동갑내기의 큰 눈도 보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한평 반의 평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래된 아내 (0) | 2009.10.31 |
|---|---|
| 노래방 3호실 손님 (0) | 2009.10.31 |
| '작은 집'에서 나를 만나다 (0) | 2009.10.31 |
| 아버지의 뗏목(2006년 8월 8일) (0) | 2009.10.31 |
| 파란 하늘 큰 나무 아래 (2006년 7월 11일) (0) | 2009.10.31 |